굿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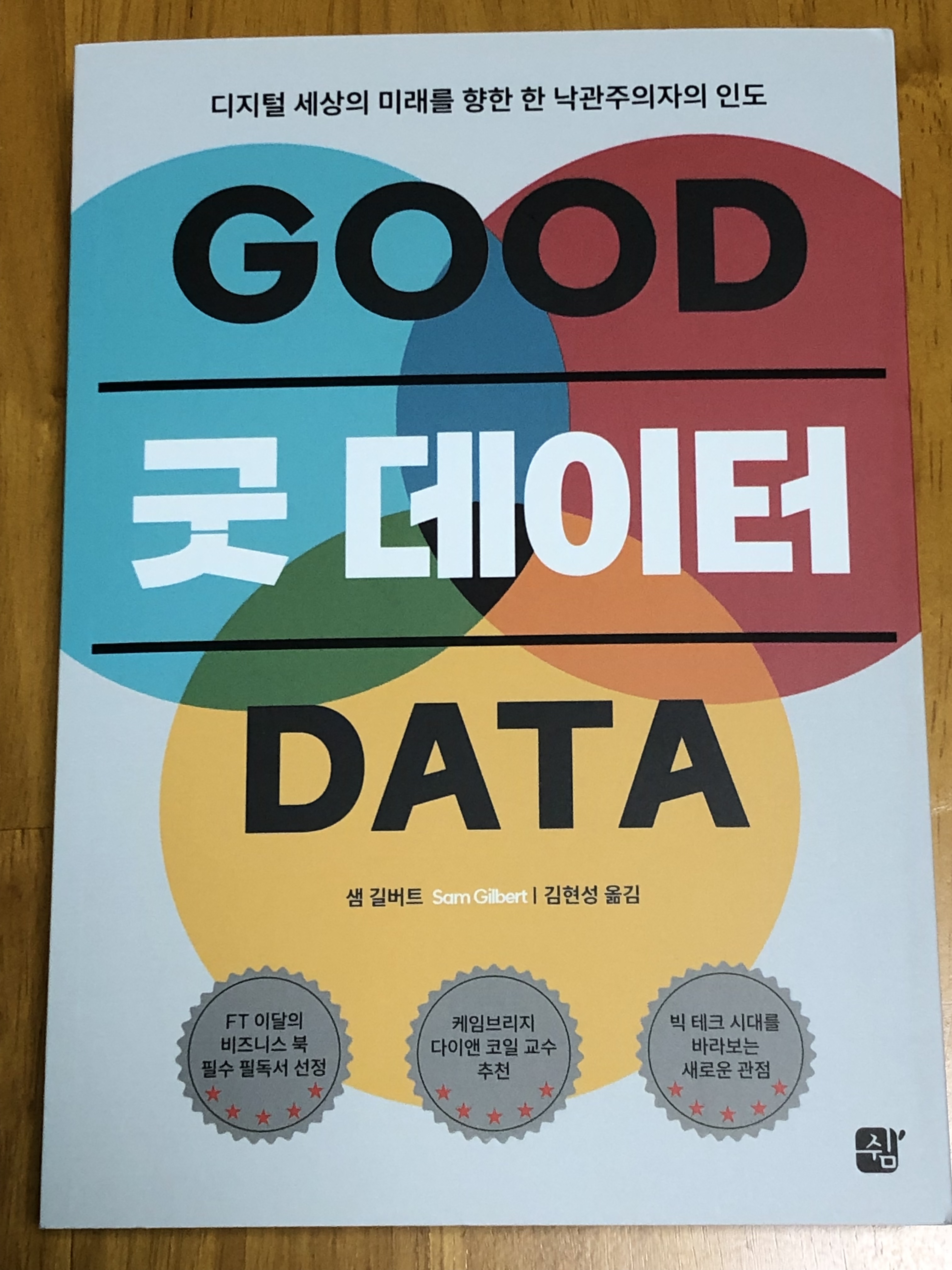
논문이든 책이든, 최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중독을 일으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과소비와 향락적인 행동을 무분별하게 드러낸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온라인 행동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마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온갖 증명을 한 이후에야 겨우 가능한 것이 되었다. 솔직히 좀 지겹다.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분석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면, 대체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모두 다 중독인 것인가? 그리고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그렇게도 나쁜 행동들의 산물이며, 그에 대한 분석 역시 바람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고 싶었다. 지난 번에 읽었던 <알고리즘이 지배한다는 착각>에 이어, 최근 <굿 데이터>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부터 저자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같았다.
사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책의 전반부 절반에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읽고 싶었던 얘기가 전반부에 다 있다고 해야 할까.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타겟팅은 기존에 이어져오던 방식에 비해 크게 다른 방식이 아니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지가 문제일 뿐 도구 자체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당연한 말이다. 통계적인 도구 자체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각이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부당한) 결과를 얻었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또한 구글 트렌드와 같은 검색 행동 데이터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익명화된 검색 행동 데이터는 사회에 매우 큰 공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미 이런 방향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리나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 논쟁 자체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거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기 때문이다. 저자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책의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책을 재미없게 만든 것 같다. 후반부에도 전반부처럼 저자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철학적 근거들에 더 관심있는 독자들이라면 후반부가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